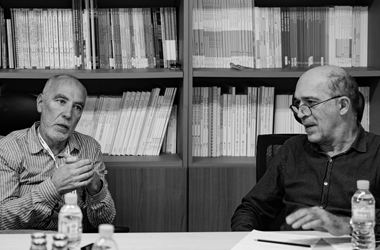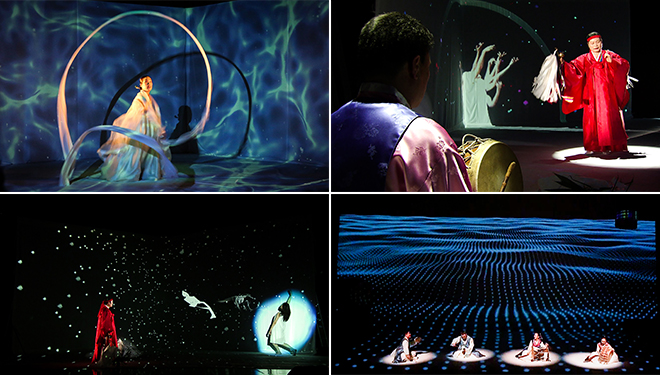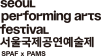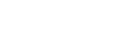글: 프랭수아 콜베르 François Colbert,
앙드레 쿠체스네 André Courchesne / HEC Montreal 경영대학원
머리말
캐나다는 1950년대부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 정책을 혼재하여 집행해왔다. 첫째, 예술 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을 공공 후원자들이 지원하는 유형(the Public Patron model), 둘째, 문화부를 설립하여 총체적인 지원을 하는 유형(the Architecture model) 그리고 세금 감면을 통한 문화예술을 간접 지원하는 유형(the Enabler model)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캐나다 문화정책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캐나다문화정책의 목표와 각종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1948년 사스카츄완 예술 관리위원회(Saskatchewan Arts Board)가 북미최초로 공공 예술기구로 설립되어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를 지원했다. 1956년에는 몬트리올 시정부가 시 정부 산하 예술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57년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위원회(Canada Council)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영국식 모델(되도록 이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동료 예술인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을 본뜬 것이다. 현재는 거의 모든 캐나다의 주 와 주요 도시들에 예술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이는 루이스 로렌(Louis St-Laurent)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예술위원회를 설립했을 때 그가 지녔던 철학의 영향을 폭넓게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 정부는 국가의 문화발전을 지원해야 하지만 문화발전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1961년, 퀘벡(Quebec) 주 정부는 캐나다 최초로 총체적 지원 유형 원칙에 따라 (Architecture model) 문화부를 신설했다. (프랑스의 전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1963년 연방정부는 국무부(현재는 캐나다 문화 유산 관리부<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이는 문화, 예술계를 연방/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화부서들이 설립되어있고 주요도시들에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부서들이 있다. 주로 공공 도서관, 시 정부 산하 박물관, 각종 문화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캐나다에는 문화/예술간접지원모델(Enabler model) 이라는 3번째 예술계 지원 유형이 도입되었다. 이는 세금 감면혜택을 통해 문화산업(영화, 도서, 음악 등)을 먼저 지원하는 한편, 비영리 문화단체들은 기부금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말하는 것이다. 공식적 문화정책을 시행한적이 없는 연방정부라 하더라도 문화/ 예술계에 대한 공식위원회의 보고서들을 많이 여러 번 후원해왔다.
• (1936) 캐나다 방송(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36) 설립을 권고하는 Aird 위원회 보고서(1929)
• (1957)국립 도서관(National Library, 1953) 과 캐나다 위원회(Canada Council, 1957)설립을 권고하는 Massey-Levesque 보고서 (1951)
• 이중언어정책(bilingualism) 과 두 문화 공존정책(biculturalism)에 대한 Laurendeau-Dunton 보고서 (1963)
• 예술계 대한 정부의 공식적 지원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연방정부기관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Applebaum-Hébert 보고서 (1982)
• 공공 방송체계와 캐나다 텔레비전 기금(Canadian Television Fund, 1996) 의 신설을 권고하는 Sauvageau-Caplan 보고서 (1986)
• 새로운 저작권법을, 예술가들을 위한 세금 감면뿐 아니라 공대권 (公貸權)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하여 저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을 권고하는 전문예술인들 교육에 대한 White-Rossignol 보고서 (1991)
• 다른 주요문화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신설되었다. 예컨대, 캐나다 영화 위원회(the Canadian Film Board, 1939), 사단법인 국립 박물관 (the National Museums Corporation, 1968) 텔레필름(Telefilm, 1968) 등이 있다. 2006-7년에는, 연방정부는 문화부문에 3십7억달러(방송분야에 47%, 박물관, 공식문서 기록보관소, 역사적인 자연 공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적지를 포함한 문화유산에 26%, 예술계에 7%), 을 지원했고, 지방정부들은 2십6억달러(도서관에 37%, 문화유산분야에 27%, 예술계 쪽에 10%)을 지출했다. 시 정부들은 총 2십4억달러(도서관에 72%)의 비용을 썼다.
현재의 목표와 현안들
캐나다의 문화기관들은 매우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서 현재 처해있는 문제도 비슷하다.
1.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도 캐나다는 여전히 규모가 작은 시장이다.
캐나다의 문화정책이 1950년대 이후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주된 문제는 캐나다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가 강력한 미국대중문화와 경쟁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예술인들의 수요층 인구가 캐나다 전역에 듬성듬성 흩어져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국내의 예술발전 상황도 열악한 마당에 캐나다의 예술인들은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을까? 1980년대 말,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과 관련한 토론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핵심사안으로 떠올라서 결국 무역협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반세기 동안, 캐나다의 공식적 문화기관들은 자국의 시장이 매우 제한되어있다는 고려하여,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문화의 발전을 도모했다. 오늘날,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우리는 UN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에서도 적극 지지하는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전제로 좀더 폭넓은 시야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 융통성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작은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문화대국으로 성공하는 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것 이었다. 성공요인은 첫째, 국경이 서로 개방되어있다는 점, 둘째, 편리한 교통 및 통신수단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문화예술시장을 발전, 확대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국제적인 예술작품 프로모션, 순회공연 및 순회 작품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철회하여, 문화계전반에 우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조, 생산,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면서, 이것이 캐나다 예술인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캐나다의 모든 주들이 하나같이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자신들만의 문화, 예술의 국제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강화해 나가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는 도서, 잡지,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등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소위 “캐나다만의 컨텐츠”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조항(캐나다 문화정책의 기반)이 있는데 현재 국제무대에서 활동중인 주요예술인들 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캐나다 정부가 통제 해야 한다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영화의 경우) 캐나다 예술인들의 수를 규제 해야 한다는 점과 (도서, 공연예술, 대중매체 예술분야 등) 소위 “캐나다만의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현대예술의 여러 가지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논란이 많다.
2.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립된 예술, 문화전통
캐나다의 문화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영국식 모델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1980에, 국가 재정위원회가 관리, 감독 강화라는 목적으로 캐나다 위원회(Canada Council) 와 사회, 인문과학 연구조사 위원회(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와 같은 문화단체 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캐나다 위원회(the Canada Council) 와 국립예술센터(the National Arts Centre)는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하였고 1982년 Applebaum-Hébert 보고서에서 이 문화단체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목적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84년 캐나다 정부는 결국 연방정부 산하 문화기관들의 자치권을 안정하는 법을 채택했다.
2009년 사회, 인문 과학연구조사위원회(SSHRC)운영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에서 토론토대학(the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토론회를 지지한다는 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막으려고 위원회(SSHRC)의 다음해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위협 했다. 캐나다 대학교수 협의회(The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와 언론매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여 결국 정부부서는 위원회(SSHRC)의 결정을 따랐다.
3. 문화의 기반으로서의 언어
캐나다처럼2개의 공용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쓴다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 문화 기관들이 내세우는 주된 특징이다. 이런 사실은 1959년 이후 캐나다 공용어들을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하는 주 장관 문학상(the Governor General Literary Awards) 을 수여한다는 점을 보면 잘 나타난다. 방송, 영화제작, 출판, 사운드 녹음과 극예술 등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현상이 뚜렷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정분야를 목표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1985년 연방 정부기관인 Factor와 Musication 가 자매결연을 맺어 사운드 녹음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여러 지방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다.
퀘벡에서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적 사안들을 다룬 수많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어를 퀘벡 문화의 기반이자 퀘벡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확실히 인식해왔다. 1992년 퀘벡은 최초로 공식적인 문화정책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퀘벡 예술, 문학위원회(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du Québec) 가 설립되어 전반적인 예술분야를 지원하게 되었고, 문화산업 발전 협회(Société de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ulturelles) 가 신설되어 문화산업지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엘버타(Alberta) 주는 가장 최근에 문화의 접근성, 탁월한 예술인들의 능력, 지역적인 문화생산능력을 구축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와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채택했다.
4. 다양한 곳에서의 자금지원
과거 수년 동안, 캐나다 정부는 또한 문화 간접지원모델(the Enabler model)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전략들을 융통성 있게 문화경제학 각 분야에 맞게 조정하여 도입하였다. 대체적으로 세금징수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 덕분에 예컨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공공투자를 할 수 있었다.
- 영화 또는 비디오 제작 회사에 대한 세금 공제
- 음악인들을 위해 투자금 지급
- 예술적 재능을 인정하여 문화예술 기관에 부여하는 소득세 공제혜택
캐나다 텔레비전 기금재단(The Canadian Television Fund, 1996) 은 캐나다 정부와 케이블 및 위성방송산업간의 민간-공공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계에 자금지원을 하는 또 다른 단체이다. 케이블 채널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취향대로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게 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광고 홍보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 또한 인터넷이 더욱더 맹위를 떨치게 되면서 기존의 방송사들의 광고홍보수익이 감소하게 되었다. 2009년, 이러한 주류 방송업자들이 케이블, 위성방송 가입자들로부터 시청료 납부를 요구했다. 이 납부금을 통해 광고 홍보 비 손실을 메우고, 수준 높은 “캐나다만이 가진 컨텐츠” 제작비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은 3가지 전통적 방식의 문화, 예술 지원 자금의 원천 (입장권 판매 수입 등의 문화 예술계에 이미 축적된 소득, 후원, 기부금 등의 민간 소득 과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공공 소득) 이 서로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의 금융위기 시기에, 캐나다에 있는 대다수 예술 단체들은 민간 소득이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축적, 민간, 공공 자금 원을 더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 한 덕분에 미국의 예술단체들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이러한 문화, 예술계 지원모델은 또한 중앙집권화된 획일적인 지원 모델보다 예술적인 다양성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경우 각 정부 부서 단계적으로 담당 직원들간의 평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지방 및 시정부의 지원이 지난 수년간 늘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지원금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캐나다 위원회 (Canada Council) 부회장이자 컬쳐 몬트리올 (Culture Montreal, 비영리 민간 문화, 예술지원 조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이먼 브롤트(Simon Brault) 같은 베테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사실은 문화, 예술계 자금 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됐고, 그렇게 되어야 문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술적인 창작이 철저히 보호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화, 예술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원천이며, 반드시 예술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지닌 민간이나 기관이 끊임없이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
공연예술 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기 때문에 예술단체 쪽에 민간의 지원금을 통한 수익 창출 (기업의 기부금, 각종 재단 및 지원금) 부분 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현금 후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창출부분 에 끼친 여파가 가장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비용을 줄이고 직원고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여론조사에 응했던 단체들 중 3분의 1은 공연 프로그램을 변경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분의 1은 관객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도입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많은 예술단체들은 이제 반드시 관객수, 순회공연, 투어 횟수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좀더 많은 공연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여야 한다.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 하는 대 도시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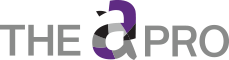

 PREV
P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