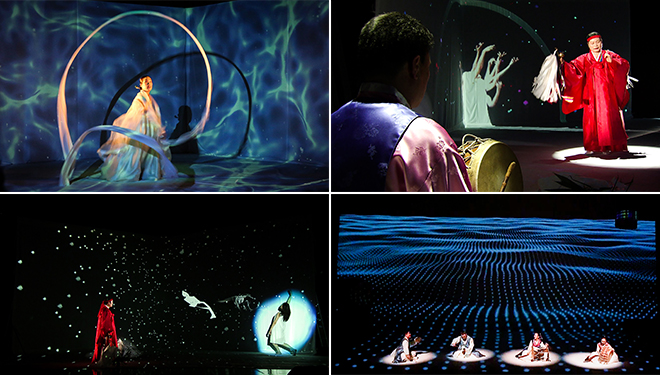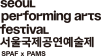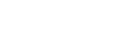정치와 예술의 거리 재기
[축제/마켓] 2014 호주아트마켓 리뷰
호주아트마켓(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APAM)은 애들레이드(Adelaide)에서 브리즈번(Brisbane)으로 옮겨 올해 2월에 처음 열렸다. 이런 변화에 처음에는 호기심과 우려가 동시에 들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건 흥분된 일이기도 하지만 낯설기도 하기 때문이다. 낯익은 거리와 이름을 뒤로하고, 새로운 방식과 얼굴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인데, 공연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 변화를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하는 호주아트마켓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번 마켓의 하이라이트를 일자별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감지되는 새롭고 다채로운 면모를 공유해 보겠다.
Day 1
발음도 낯선 브리즈번 공항에 내리니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다. 10시간을 건너온 호주는 계절부터 한국과는 정반대였다. 동시에 뭔가 애들레이드와는 다른 기운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세심하게 짜인 스케줄과 촘촘한 정보를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얼굴에 열이 올랐다. 미리 준비한 오찬은 야외의 커다란 텐트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연사들은 끊임없이 농담을 하며 도저히 진지해질 줄 모르는 세리머니를 이어갔다. 아마도 퀸즐랜드 방식인 듯했지만 꽤 낯설었다. 기조연설에 앞서 오프닝 공연이 시작되었다. 원주민에 대한 오마주는 이제 호주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이날도 무당 같은 그녀가 원주민 노래를 중얼거리며 일종의 굿거리를 했다. 그 사이사이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지만, 첫날의 여정이 너무 긴 탓에 일찌감치 호텔로 들어와 잠을 청했다. 내일부터 진짜 긴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
|
|
| 키노트 스피치 | 부스 사진 |
Day 2
오전에는 한-호 커넥션(Korea-Australia Connection Initiative) 사업에 참여하는 양쪽 공연관계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이번 마켓의 주요 장소인 브리즈번 파워하우스(Brisbane Powerhouse)는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지중해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예술감독 크리스(Kris Stuart)는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뜨거운 햇살과 강변의 바람이 마치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착각을 불러왔다. 하지만 무릇 국제공동 작업은 지난하고도 힘든 일 투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과 호주 간의 장기적인 공연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만큼 더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길 바란다. 예를 들면 멜번과 서울의 동시대 공연자들간의 랩(Lab)을 만들어보고, 3년 이상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번 마켓에는 한국과 호주의 공동제작 <지하(Underground)>
하지만 호주사람들은 역시나 만사에 여유가 있고 느려서, 나는 점심을 기다리다 지쳐서 빵도 못 먹어보고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Session)로 향했다. 역시 스피드로는 한국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 배는 고팠지만 시작 전부터 길게 줄 서 있는 참가자들을 보고서, 긴장의 끈을 조이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라운드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20분 간격으로 4번씩 이뤄지는 일종의 벼락치기 시험준비장 같은 세션이다. 내가 공동 체어를 맡은 테이블의 주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노하우’라는 것이었는데, 주로 한국에 공연을 팔고 싶은 해외 프로듀서들이 신청해서 경청했다. 하이서울(Hi Seoul) 김종석 감독과 아시테지(ASSITEJ Korea) 김숙희 이사장이 배석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전해주고 질의응답을 했다. 같은 말을 4번 반복하고 나니, 자동으로 3-4번은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가 생겨버렸다. 뭐든 하면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
|
|
| 라운드 테이블 | 파워하우스 (사진출처_ http://badaso.tistory.com/422) |
Day 3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런치타임 워크숍을 꼽을 수 있겠다. 뭘 하려고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모았나 싶었더니, 종이 봉투에 샌드위치를 준비해두고 테이블마다 10명 정도씩 참가자들을 신청받았는데, 100명이 조기에 매진된 프로그램이다. 나를 포함한 4명의 패널과 2명의 사회자는 10개의 테이블 중간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공연예술 현황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 (그들이 밥을 먹으며 듣는 동안). 그리고는 테이블마다 40여 분 정도 앞의 논의 내용에 이어 자신들의 관심사를 토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마지막 20여 분은 주요 논점을 같이 공유하는 피드백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솔직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도 마켓이라는 환경에서 프리젠터와 프로듀서가 갑과 을이 아닌 동반자로 만나야 한다는 대목이 맘에 와 닿았다. 역시 이들은 발표와 토론에 능한 민족이었다. 대충 듣고 대충 동의하는 우리네 문화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스카이프(Skype) 미팅을 한 시간여 진행했고(패널이 호주, 아일랜드, 한국), 전날도 모여서 한 시간 가량 시뮬레이션을 했다.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 여러 번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피드백이 세심하게 이루어지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
|
| 런치타임 워크숍 |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이에도 한국에서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로밍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을 텐데도 끈질기게 전화하는 걸 보니 뭔가 급한 용무인가 보다. 아니나다를까, 전화 내용은 잠을 확 깨게 하는 내용이었다. 대전과 브리즈번은 기온만큼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난 이 두 다른 세계를 연결할 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마켓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끝끝내 찾지 못할 해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호주나 서방세계도 문화가 정치로 부터 완전한 거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서, 누가 어디에 갔다더라는 가십이 이런 마켓에서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지만 적어도 공연계 내에서 자리를 움직이는 정도이기에, 정치적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우리와는 그 종류가 다르다. 아…정치여, 네 영역을 지켜라, 그리하면 우리 문화가 꽃필 것이다.
그나마 나의 오후는 업계 친구인 아그네스를 만나서 같이 신세 한탄을 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녀와 나는 9년 정도 만난 사이인데, 프랑스나 한국의 환경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며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캐나다에서 온 푸시 페스티벌(Push Festival)의 노먼도 더 구부정해진 등을 뒤로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다. 벤쿠버의 동시대 공연예술제 감독인데, 허연 머리와 한 번의 심장마비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세계를 떠돈다. 강가에 늘어선 우리는 와인을 홀짝이며 각자의 시각과 공연을 얘기하며 밤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날 본 공연의 하이라이트는<제 이름은요(Hello, My Name Is)>라는 원맨쇼였는데 니콜라 건(Nicola Gunn)이라는 용감한 처자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을 풍자하며 당당하게 옷을 벗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녀와는 이후로 같이 작업을 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가볍지만 센 무기를 대전 관객과 함께 나눌 기회를 기대해 본다.
|
|
|
| L) 니콜라 건의 <제 이름은요> R)〈밖은 어두운데(It’s dark outside)〉 ◎BedBedford Theatre 페이스북 | |
Day 4
이날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아침도 만들어 먹고 공연을 이것저것 챙겨봤다. <리스티즈 (Listies)>라는 공연은 너무 유치하게 웃겨서 간만에 소리 내어 웃었다. 코미디인데 마켓 자체를 풍자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밖은 어두운데(It’s Dark Outside)>라는 공연은 노년에 대한 따듯한 시각으로 가슴을 촉촉이 적셨다. 점심은 한국-호주 커넥션 참가자들이 같이 모여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며칠 만에 한국 식당에서 3만원 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며, 외국에 온 향수를 달랬다. 나도 한국 사람이 맞긴 맞나보다. 호주 예술 위원회의 콜레트와 엘렌, 소피, 웬디 등 사업 관련자들이 함께 즐거이 음식을 나누며 담소했다. 역시 우먼파워였다. 호주의 예술위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정책결정에 참가한다.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론과 현실의 갭이 줄어드는 것 같다.
오후에는 ‘원스텝’(One Step at a Time Like This)과 미팅을 했다. 이 팀은 2011년에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팀이라 사연이 많다. 성실하고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거대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는 호주의 떠오르는 단체로 팀워크가 대단하다. 이들이 찾아낼 대전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 <스트림(Stream/ Boat)>이라는 공연은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사이트 스피시픽(site specific) 형태의 공연으로 브리즈번 강가에서 그들의 역사를 원주민이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의 삶까지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 시간 정도였지만 배를 타고 물가로 나가서 온갖 세속의 때를 벗는 고백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 본 <기디야 기디야(Guidir Guidir)>는 월드 시어터 페스티벌(World Theatre Festival) 작품으로 원주민의 역사를 파워풀하게 풀어낸 수작이었다.
저녁에는 호주 위원회 주최로 드링크 파티가 가든에서 열렸는데, 마치 마지막 날 밤 같았다. 어스름한 야외 정원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둘러서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와인과 피자가 어우러졌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으나 어느 누구 하나 개의치 않고 새로운 친구와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를 아쉬워하며 인사하고 있었다. 나도 이제 이 생활이 십여 년 되다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꽤나 있다. 어떤 이는 지속적으로 만나지만 먼발치서 눈빛만 봐도 충분하고, 어떤 이들은 몇 년 만에 만나도 매우 반갑다.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공연예술도 궁합이 맞아야만 지속될 수 있는 법이다. 어떤 아티스트는 처음 봤을 땐 훌륭한 아이디어로 프로듀서의 맘을 사로잡지만 결과가 별로일 때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것을 가려내고 자신만의 파트너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획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날 저녁 프랑스의 아그네스, 호주의 로지 등 몇몇의 ‘드센’ 여자들과 의기투합해서 독립국을 세울 듯이 큰소리로 떠들었다. 마치 내일모래 돌아가서 부딪힐 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잊어버리려는 듯, 그렇게 소리 내어 떠들면 그 속의 때가 마법처럼 벗겨질 것 같았다. 사실 다시 디뎌야 하는 현실은 늪처럼 눅눅하고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산처럼 쌓여있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잊고 싶었나 보다.
Day 5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서둘러 퀸즐랜드 극장(Queensland Theatre Company)을 찾았다. 대전과 브리즈번이 자매도시라 이 둘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늘려 보겠다는 야심으로 찾은 파트너이다. 극장 무대는 생각보다 널찍하고 컸으며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워크숍과 의상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도 예산 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였다. 그 대안으로 행사 대여도 해주고 지역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등을 기획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와의 스킨십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 쫓기 전략이었다. 수(Sue Donelly)는 시드니에서 예술감독과 함께 이 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와서 착실히 극장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믿음직한 매니저다.
이후에 클로징 오찬에 잠깐 참석하고 토드 맥도널드(Todd Mcdonald)의 <마운틴 탑(Mountain Top)>을 퀸즐랜드 공연예술센터(QPAC)에서 보는 걸로 나의 모든 공식적 스케줄은 막을 내렸다. 힘겹고도 신나는 5박이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난 이른 저녁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일상이 주는 달콤함을 마지막으로 맛보려는 듯이 저녁 내내 침대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그곳엔 정치가 문화를 침범하는 무식이 횡횡하지 않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돌아간 한국에서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
|
|
| 퀸즐랜드 극장 | 웰컴 런치 |

















 PREV
PREV

.jpg)
.jpg)
.jpg)